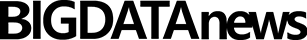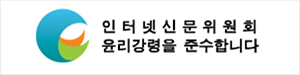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낮은 분양가 만회위해 끼워팔기 강요시 2년이하 징역 가능"

치솟는 집값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0만명 이상이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 추가 비용·감정된 토지비용을 더해 상한선을 결정한다.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는 조정된다.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자, 건설사들은 낮은 분양가를 옵션 수익으로 만회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집을 완성하는 필수 자재까지 옵션 항목에 포함시켰다. 옵션 미계약 시 시행사가 분양 최종 계약을 거절하는 불이익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주택법 54조는 옵션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법 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옵션 끼워팔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선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옵션 끼워팔기를 감시해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조례 등으로 정해져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